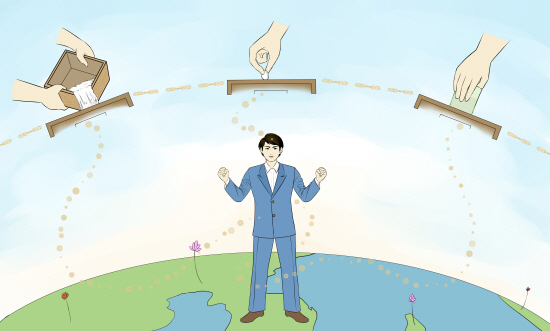실행론으로 배우는 마음공부 55-절량희사와 차별희사 공덕
뉴스 원문 정보
원문 : http://milgyonews.net/news/detail.php?wr_id=29232작성 : 편집부
“절량희사의 묘덕은 식량이 떨어지지 아니하며 일체 재난이 일어나지 않는다. 차별희사의 묘덕은 무슨 소원이든지 낱낱이 이루어진다. 단시의 묘덕은 없는 사람에게는 들어오는 것이 많아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헛되게 나가는 것이 적어진다. 각자가 실천하여 보면 절량과 차별과 단시의 묘덕이 진실로 자기에게 실지묘과가 있는 것을 내증하게 된다.”(실행론 제3편 제8장 제7절)
대나무 숲의 비밀
대기씨가 날마다 너털웃음을 터트릴 때 벌어진 입은 함지박 만하게 큰 얼굴보다 더 커보였다. 그 큰 얼굴이 오히려 작아 보일 정도였다. 천신만고 끝에 필리핀 신부를 얻어 신접살림을 차렸을 때였다. 시도 때도 없이 춤을 추라고 해도 싫은 기색 하나 없이 언제든지 너끈히 해낼 판이었다. 두 사람만을 위한 보금자리인 집과 터전도 그만하면 나무랄 게 없었다. 비록 산비탈에 의지해 있는 좁은 곳이기는 했지만 새집을 가진 기분만큼은 천하를 다 얻은 듯싶었다. 방 하나에 거실, 쪽마루가 딸려 있는 소박한 곳으로 품안에 쏙 들어온 듯해서 더 좋았다. 어느 부잣집이나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고대광실이 부럽지 않았다. 집이 문제될 수 없었고, 재산이 문제될 까닭도 없었다.
나이만 봐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처지였다. 식솔을 거느릴 형편으로만 따져봐서도 세월이 흐른다고 뾰족한 수가 생길 것 같지 않은 때였다. 마침 외국인중매전문가를 만났다. 하늘이 보호하고 천지신령이 돕는다는 것을 눈물 나게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운 점이 영 없지는 않겠지만 형편에 맞춰 착하게 살려고 무던히도 애를 쓴 흔적은 남아 있어서 도움을 받는 느낌이었다. 소개를 받은 신부는 대기씨를 위해 태어났던 사람 마냥 맞춤형에 다름 아니었다. 작달막한 사람이었지만 다부진 구석이 있었다. 둥글납작한 얼굴이었지만 복스러운 데가 있었다. 말을 알아들을 수야 없었지만 표정만으로도 좋아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철따라 농사를 지었다.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서 부부가 충분히 먹고 남은 것은 차곡차곡 곳간에 저장했다가 장터에 나가 내다 팔아서 집안을 건사했다. 농사지은 것을 돈으로 바꿔 집으로 돌아올 때는 덩실덩실 춤도 추었다. 부부가 손을 맞잡고 강강술래를 하듯 같이 추는 춤사위는 달 속의 토끼들이 노니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했다. 그를 지켜보았던 동네 사람들은 보기 좋았다고, 아름다웠다고 한 마디씩 해주었다. 사람이 하늘을 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해보곤 했다.
하늘로 날아오르는 꿈도 오래 가지는 않았다. 어느 순간부터 대기씨는 아내가 무언가를 의심하는 눈치가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자기를 바라보는 눈초리가 언제부턴가 달라보였던 것이다. 부부가 금술 좋게 4년을 지내고 5년째가 되던 해였다. 직설적이고 분명한 것을 좋아했던 아내는 급기야 대기씨를 앉혀놓고 가슴 속에 품어왔던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일부러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인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인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대기씨는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다. 화를 낼 수도 없었다.
자식을 갖고 싶었던 마음이야 대기씨도 마찬가지였다. 두 말 하면 잔소리였다. 오히려 더 간절했는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아내를 생각해서 차마 입 밖으로 말조차 꺼내지 못하고 있었던 참이었다. 행여나 마음을 다칠까봐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아내의 눈치만 봐왔던 터였다. 혼자서 들일을 할 때도 제대로 한숨 한 번 내쉬어본 적이 없었다. 그만큼 조심하고 또 조심했다.
대기씨는 혼자 대나무밭으로 갔다. 말라서 바닥으로 떨어진 댓잎은 걸음을 걸을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동안 참아내고 버텨준 아내의 가슴에서 나는 소리 같았다. 대기씨는 몇 걸음을 걷지 못하고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아내를 짓밟는 듯한 느낌이라 더 이상 발걸음을 옮겨놓을 수조차 없었다. 임금님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소리치고 싶은 심정이었다. 대기씨는 외국인중매전문가의 말을 믿고 따랐으며 그대로 실천한 것뿐이었다. 5년 안에 아내가 임신을 하도록 하면 안 된다는 것과 자기가 그렇게 시켰다는 것을 어느 누구에게도 발설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약속을 지켰을 뿐이었다. 몇 번이고 어길까 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했지만 자식이 대수냐 싶어 그 때마다 좌절하면서 의지를 꺾고 말았다. 자식을 낳은 뒤 아내가 도망이라도 가버리면 제 아무리 큰 영화를 누린다 한들 무엇 하랴 싶었던 것이다.
대나무는 신접살림을 차릴 때 집 주변으로 심어놓은 것이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한 끝에 아이 이야기를 꺼내 놓은 아내의 기다림만큼 긴 시간이 흐른 것을 실감나게 하듯이 대나무는 숲을 이루고 있었다. 대나무는 씨앗을 심으면 5년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다. 그 동안은 땅속에서 침잠하며 뿌리를 내린다. 수천 미터는 족히 헤아릴 정도로 뿌리를 넓게 퍼트렸다가 한 순간 수십 내지 수백 개의 죽순을 땅 위로 밀어 올린다. 그동안은 이 순간을 위해 열심히 자양분을 저장해 둔다는 것이다. 때를 만나서야 한꺼번에 급성장시키는 속성을 발현한다. 이 성장 속도는 무려 보통 나무의 수백 배에 이른다고 한다. 하루에도 엄청난 속도로 자라나면서 수일 만에 집중적으로 성장하기에 대나무의 속이 비어있다는 이야기도 하고는 한다.
“아버지, 아버지 어디 있어예. 아버지이.”
먼 발치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대기씨는 대나무 숲에 이는 바람 소리려니 하고 반쯤 뜨인 눈을 다시 감았다. 한나절 일을 끝내고 시원한 대숲에 누워서 꾸는 꿈은 달콤했다. 신혼을 찾아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혼자만의 여행을 하는 기분이었다. 천하의 어떤 즐거움과도, 맛있는 음식과도 바꿀 수 없는 찰나의 세계를 만끽했다. 헤벌쭉 벌어진 입가에는 침까지 흐르고 있었다. 대기씨를 부르는 소리가 점점 가깝게 들렸다. 아이들이 대기씨를 찾고 있었다. 오전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여느 날보다 많이도 늦었던 탓이었다.
“여그야, 여그. 아부지 여그 있어야. 뭣땜시 그리 찾아싸야.”
대기씨가 벌떡 몸을 일으키며 아이들을 불렀다. 아이들은 대기씨가 다리를 두었던 방향에서 금방 달려왔다.
“찬찬히들 와야. 그러다가 넘어지겠다아.”
대기씨는 순식간 눈앞에 나타난 아이를 덥석 안아서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으려 했다. 먼저 달려와서 첫 번째 안겨들었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하면서 대기씨의 팔을 잡고 늘어졌다.
“욕심 부리면 안 되지.”
짧고 굵은 한 마디였다. 멀찌감치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아내의 말 한 마디에 둘째 아들은 두 말 않고 물러났다. 아내의 말은 짧았지만 울림은 컸다. 두 아들은 아내의 말에 쩔쩔 맸다. 할 말이 있을 때는 정정당당하게 자기의 주장을 하게 했다. 그러나 어영부영 엉겨 붙으려는 식의 투정이나 억지스러움은 절대 용납되지 않았다. 때로는 아이들에게 너무 심하다 싶어 대기씨가 끼어들었다가 오히려 혼이 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대기씨는 멋쩍은 듯 옆에 서 있던 큰아들을 번쩍 들어올렸다. 그리고는 목말을 태운 채 대나무밭을 성큼성큼 걸어 나갔다. 둘째 아들은 한 발도 움직이지 않았다. 형은 동생을 놀려주려는 듯 대기씨에게 빨리 가자고 재촉했다. 대기씨도 둘째 아들의 투정을 모른 채 버려두고 걸음을 재촉했다. 둘째 아들은 아내의 등에 업혀서 대나무밭을 나섰다.
정유제/소설가
(2).gif)